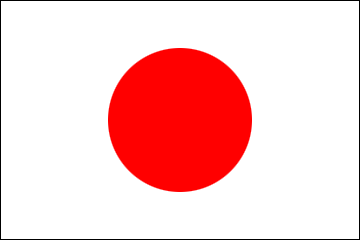'네쓰케'란? –「현대・목조・네쓰케전(일본 현대 공예전)」을 보러 가기 전에 –
2020/11/3
여기에서는 '네쓰케'의 역사나 매력에 대해 소개합니다. 「현대·목조·네쓰케전(일본 현대 공예전)」을 보러 가기 전에 참고하시면 작품을 즐기고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쓰케의 정의와 특징
와타나베 마사노리(渡邊正憲)
네쓰케는 에도시대에 왕성하게 제작되었던 작은 세공품이다. 일본옷 문화(和装文化)가 한창 꽃피던 무렵, 사람들은 인롱, 담배쌈지, 염낭 같은 사게모노를 허리띠인 오비에서 끈으로 늘어뜨리고 다녔다. 그리고 끈의 끝자락에 매단 다음 오비 밑으로부터 질러 넣어 오비의 윗부분에 고정시킴으로써 사게모노가 흘러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도메구 곧 고정 장치 기능을 갖게 한 것이 바로 네쓰케였다. 당초에는 작은 조롱박이나 상아를 둥글게 자른 것 등 세공을 가하지 않은 실용 위주의 소박한 것들이었으나 점차 손이 많이 간 섬세한 공예품이 되고, 갖가지 디자인을 아로새긴 미술적 가치가 있는 뛰어난 네쓰케가 제작되게 되었다.
네쓰케가 단순한 작은 조각품과 다른 것은 도메구로서의 역할 곧 고정 장치 구실을 하는 실용성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끈을 끼우기 위한 두 개의 구멍이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구멍에 끈을 끼워 오비에 고정시켰을 때에 네쓰케의 디자인이 제 방향으로 향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동물이 거꾸로 서 있거나 사람이 등을 보이고 있거나 하면, 끈 끼우는 구멍의 위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된다. 현대에는 실제 쓰임새가 거의 없어진 탓에 시늉만 내는 정도로 구멍을 작게 뚫은 것도 볼 수 있지만, 끈을 끼울 수 없다면 네쓰케라고는 말할 수 없다. 끈 끼우는 구멍은 서 있는 사람이라면 등 쪽에, 옆으로 누운 동물이면 밑 부분에 뚫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람의 팔과 몸통 사이나 동물의 다리와 몸 사이의 자연스러운 틈새를 이용하여 끈을 끼우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두 번째 조건은, 네쓰케를 장착하거나 떼거나 할 때 기모노나 오비에 걸려 천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궁리하는 것이다. 튀어나온 곳이 적고,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한 형태를 띤 것이 기능적인 네쓰케이다.
세 번째 조건은, 사방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손이 안 간 데 없이 제대로 조각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쓰케는 방안에 두는 장식품처럼 놓아둔 상태로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에 올려놓고 천천히 굴려가면서 모든 면을 감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작가의 의도나 기교를 발견하는 것도 네쓰케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네쓰케의 역사
다니다 유시(谷田有史)
‘네쓰케’는 염낭, 인롱, 담배쌈지 등 이른바 ‘사게모노’를 오비에서 늘어뜨릴 때 사용하는, 이를테면 흘러내림 방지 도구이다. 일본 옷 기모노에는 양복처럼 호주머니가 달려 있지 않다 보니 사게모노를 차고 다니려면 오비에 매다는 수밖에 없었다.
네쓰케의 어원으로는 1. 나무뿌리를 붙였다, 2. 끈의 끝자락에 붙였다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그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치 않다. 에도시대 초기의 풍속을 그린 풍속화 등을 보면, 팔찌 같은 둥근 모양의 네쓰케로서 사게모노를 끈으로 묶고 고리 부분에 오비를 끼운 모습을 묘사한 것이 있다. 이처럼 사게모노를 오비에 고정시키는 용도로 쓰인 것은 예로부터 오비구루마(帯車), 오비구루와(帯ぐる輪)로 불리고 있다. 다만 오비구루마의 경우, 일일이 오비를 풀지 않고서는 사게모노를 뺄 수가 없어 불편했던 탓에 고리 모양의 것은 차츰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 후, 당초에는 나뭇가지를 둥글게 자른 것이나 조롱박 등 주변에 있는 천연의 것들을 오비구루마 대신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조각이나 그림 붙이기가 더해지게 된다. 이윽고 불사(佛師)나 화사(畫師) 혹은 목공 및 금공 장인 등도 네쓰케 제작에 손을 대기에 이르렀고, 에도시대 중엽에는 네쓰케를 전문으로 만드는 네쓰케시(根付師)라는 직업도 생겨났다.
에도시대 중기 이후에 융성의 극치를 이룬 네쓰케이지만, 메이지 유신(1868)을 맞아 문명개화의 세상이 도래하자 점차 전통 옷인 와후쿠(和服)에서 호주머니가 달린 양복으로 복장이 변화하고, 동시에 새로운 흡연 풍속으로서 종이로 만 담배인 궐련(cigarette)의 등장과 함께 발화 도구로 성냥이 등장함으로써 큰 전환점을 맞이한다. 더욱이 서양문화를 숭배한 나머지 예로부터 내려오는 일본의 문화는 경시되고, 메이지 이후 미술품들이 대거 해외로 유출되었는데, 네쓰케도 외국인에 의해 수집되는 운명을 걷는다. 네쓰케의 경우 이런 경향은 더욱 뚜렷하여 에도시대에 제작된 것뿐만 아니라 메이지시대・다이쇼시대・쇼와시대 초기에 걸쳐 제작(수출용으로 제작한 것도 포함)된 것들도 대부분이 바다를 건넜다. 이는 태평양전쟁 중의 한 시기를 제외하고 전후까지 계속되었다.
네쓰케의 제작은 태평양전쟁 후에도 근근이 이어졌다. 그런 상황 속에서 1971년 미국의 네쓰케 수집가인 로버트와 미리엄 킨제이 부부가 일본에 오게 되면서, 그 후 활약하는 일본인 네쓰케 작가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주었다. 킨제이 부부는 일본인 네쓰케 작가들에게 에도시대 이래의 전통에만 의존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현대적 감각으로 네쓰케를 제작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는데, 이에 호응한 상아 조각 출신의 작가가 독자적인 네쓰케를 창작하기 시작하며 ‘현대 네쓰케’운동이 일어났다. 그 중심이 된 것이 사이토 비슈(斎藤美洲), 다치하라 칸교쿠(立原寛玉), 사쿠라이 히데유키(桜井英之), 고마다 류시(駒田柳之)들로서 이 운동이 서서히 확산세를 보이다가 1977년에는 네쓰케연구회가 설립되고, 나중에는 외국인 작가도 참여하여 국제네쓰케협회로 발전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대・목조・네쓰케전(일본 현대 공예전)」 개요는 여기를 참고하십시오.